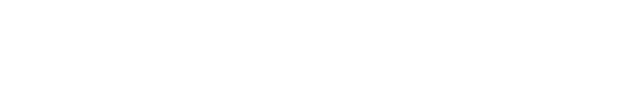나무와 새
by 정갑숙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 햇살 따사로운 봄날
새 한 마리 날아와 나무 위에 앉는다.
부러운 나무는 새를 보며 말한다.
"나도 너처럼 하늘을 날고싶다"
나무의 마음을 안 새는 가슴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하늘 푸른 여름날
"우리처럼 하늘을 날고 싶으면 네가 가진 것 다 나눠주어야 해."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야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새가 알려준다.
하늘 맑은 가을날
새의 말을 기억한 나무는 열매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
그리고 빈 손을 펼쳐든다.
차거운 겨울날
가지에 앉아 놀아주던 새도 남쪽나라로 떠났다.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입고 있던 옷들까지 다 벗어준다.
풀섶에서 떨고 있을 작은 벌레들을 위하여.
하늘은
가진 것을 다 주는 나무의 마음을 알고
하얀 솜이불을 펼쳐 나무를 덮어준다.
솜이불을 덮고 누운 나무는 이제 꿈을 꾼다.
한 마리 새가 되어 훨훨 날고 있다.
하늘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정갑숙
1963년 경남 하동 출생
부산 신라대 국사교육과 졸업
아동문예 문학상 수상
- <나무와 새>를 뽑고나서
- 유경환
묘목으로 심은 나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테 중심에 나무의 일생동안 자리하게 된다. 아동문학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일반문학의 기초부문에 해당하는 위상을 지닌다. 따라서 문학작품으로서의 품격과 향기를 지녀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시적인 요건을 구비한 작품이라야, 인생이 위로와 위안을 필요로 할 때 아동문학으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동시는 고운말 예쁜말의 조합이 아니다. 형식은 동시라 할지라도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시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시어의 선택에서나 전개 기법에서나 오히려 성인문학에서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동시다.
이런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이번에 당선된 정갑숙씨의 '나무와 새'이다. 당선은, 출발점에서의 좋은 시작일 뿐이다. 
정갑숙
1963년 경남 하동 출생
부산 신라대 국사교육과 졸업
아동문예 문학상 수상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날 저녁, 당선의 소식을 전해받고 기쁨의 전율에 싸였다. 한동안 정지된 시간, 마비된 감각, 너무 큰 기쁨이 예고도 없니 밀려오니, 그 기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동안 동시를 위해 애쓴 무수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한 줄의 동시를 위해 몸부림치던 나,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허기, 나는 날마다 비틀거렸다.
'배가 고파 칭얼대는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물려주듯, 동시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내게 하느님은 신춘문예의 영광을 안겨주었을까?'
당선소식을 전해받은 후, 그렇게 허기지던 순간들이 먹지 않아도 한동안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나는 다시 깨달았다. 이 기쁨, 이 영광은 나의 몫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몫이라는 걸. 그리고 내 어깨에 내려앉는 가볍지 않은 책임감이 흥분된 나를 자중시켜 주었다.
앞으로 쌩떽쥐베리의 어린 왕자나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처럼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어도 감동을 주는 동화를 꿈꾸어 본다.
제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 감사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 묵묵히 다 참아내고 아내를 지켜봐 주신 남편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동시나무를 위해 애초에 밑거름을 듬뿍 뿌려주신 김재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족, 친지, 글나라 식구들, 편지가족, 해운대 복지회관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1999년도 당선작
동시
나무와 새
by 정갑숙
동화
굴뚝에서 나온 무지개
by 정리태
문학평론
사라진 아틀란티스, 또는 텍스트의 운명
by 변지연
미술평론
이중섭 예술의 구조와 종족적 미의식
by 전인권
음악평론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음악세계
by 김동준
영화평론
일상성, 또는 갇힌 길 위의 인생
by 박명진
동아신춘문예
당선작을 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