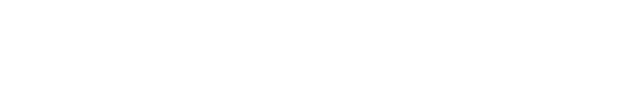이층에서 본 거리
by 김지혜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 1.
모시 반바지를 걸쳐 입은 금은방 김씨가 도로 위로 호스질을 하고 있다 아지랑이가 김씨의 장딴지를 거웃처럼 감아 오르며 일렁인다 호스의 괄약근을 밀어내며 투둑 투둑 흩뿌려지는 幻의 알약들
아 아 숨이 막혀, 미칠 것만 같아
뻐끔뻐끔 아스팔트가 더운 입김을 토하며 몸을 뒤튼다 장딴지를 감아 올린 거웃이 빳빳하게 일어서며 일제히 용두질을 시작한다 한바탕 대로와 아지랑이의 질펀한 정사가 치러진다 금은방 김씨가 잠시 호스질을 멈추고 이마에 손을 가져가 짚는다 아 아 정말 살인적이군, 살인적이야
금은방 안, 정오를 가리키는 뻐꾸기 시계의 추가 축 늘어져 있다
2.
난간, 볕에 앉아 졸고 있던 고양이가 가늘게 눈을 뜬다 수염을 당겨본다 입을 쩍 벌리며 하품을 한다 등을 활선처럼 구부린다 앞발을 쭈욱 뻗으며 온몽의 털을 세워본다 그늘은 어디쯤인가 幻想은 어디쯤인가 졸음에 겨운 눈을 두리번기린다 난간 아래에 굴비 두름을 줄줄이 꿴 트럭 한 대가 쉬파리를 부르며 멈춰져 있다 백미러에 반사된 햇빛이 이글거리며 눈을 쏘아댄다 하품을 멈춘 고양이, 맹수의 발톱을 안으로 구부려 넣는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선을 거두고 어슬렁, 난간 위의 시간으로 발을 뻗어본다 빛의 알갱이들이 권태의 발 끝에 채여 후다닥 흩어진다 권태가 이동할 때마다 幻想도 한걸음씩 비켜 선다 이윽고 권태가 지나간 난간 위로 다시 우글거리며 모여드는 햇빛,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쩌억쩍 하품을 뿜기 시작한다
3.
건너편의 창, 적색 커튼이 휘날리고 있다. 시간이 들고난 것처럼 휑하다. 안은 보이지 않는다. 일몰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 동굴 같다. 그러나 그 동굴에도 전등 켜지던 밤이 있었다. 불 밝힌 창 아래에서 토악질하던 사내. 목구멍에 검지를 집어넣고 속을 뒤집고 있었다. 돌아가 잠들기 위해 영혼을 뒤집던 사내는 전신주처럼 깡말랐었다. 깡마른 영혼들이 분주하게 오가던 골목은 그러나 이제 텅 비워져 있다. 깨진 유리창. 찢겨 울부짖는 적색 나일론 커튼. 절벽처럼 캄캄해지고 절벽처럼 늙어가는 창. 영영 주인이 돌아오지 앟는, 아직 닫히지 못한 창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창도 그런 그런 내가 끔찍할 것이다. 영원히 다물리지 않을 것만 같은 입구들이 키를 쥐고 있음을. 그 안엔 환상도 캄캄하리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창의 건너편에서 나는 매일 꼼짝않고 있으므로.
김지혜
1976년 서울 출생
1995년 동국대 국문과에 입학
1998년 교내 미당창작문학상 시부문 본상 수상
2000년 졸업후 현재 도서출판 고려원 편집부 근무.
- 김혜순(시인), 이남호(문학평론가)
예심을 거쳐서 본심 심사위원에게 전달된 25명의 작품을 찬찬히 읽었다. 모든 시들이 일정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의 한 편을 고르기는 참으로 어려웠다.
틀린 문장이 더러 눈에 거슬렸고, 장식에 치우쳐 시 한 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기조차 힘든 시들이 있었다. 깔끔한 소품도 더러 눈에 띄었으나, 그 소품에 들어찬 사유의 깊이 혹은 무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기교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너무 표피적인 상황 묘사, 상투적 세계 인식이 거슬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소 거칠지만 신인으로서의 패기, 순수한 정열을 내비치는 작품을 발견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진솔한 개성을 발견하는 기쁨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최종적으로 '풍선' 외, '풍경의 연극' 외, '이층에서 본 거리' 외, '저녁으로의 산책' 외, '돌의 산란' 외 등이 거론되었다. '풍선'외는 안정감이 있고, 비유적인 공간의 제시도 훌륭했지만, 현실적 정황의 제시가 막연하고, 시상을 이끌어가는 뒷심이 부족했다.
'풍경의 연극' 외는 기교가 빛나지만, 전체적으로 모호했고, "저녁으로의 산책" 외는 추상적, 상투적 어구들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 시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돌의 산란" 외는 시안에 뛰어난 비유적 묘사력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눈에 띄었지만 구성이 밋밋한 것이 흠이었다.
전체적으로 '이층에서 본 거리' 외는 침착한 관찰력과 욕심부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묘사력을 지니고 있었다. 시들이 가진 즉물적 상상력도 좋지만, 그 즉물성이 시대적 삶에 대한 암시까지 겸하고 있었다. 너무 기교만 부리고, 장식에 매달린 작품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가라앉은 묘사를 하는 작품이 돋보였다.
그러나 시의 뒤로 갈수록 긴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산문적으로 풀어진 것이 흠이었다. 장 시간의 논의 끝에 "이층에서 본 거리"를 당선작으로 정했다. 이번에 당선하지 못한 응모자들에게 격려를,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낸다. 
김지혜
1976년 서울 출생
1995년 동국대 국문과에 입학
1998년 교내 미당창작문학상 시부문 본상 수상
2000년 졸업후 현재 도서출판 고려원 편집부 근무.
'지옥이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간판들이 잔뜩 내걸린 거리들. 그래서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는 곳. 누구나 한번 분류되고 말면 그걸로 그만인 곳.'
글쓰기를 할 때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숨이 막히곤 할 때, 위로 받기 위해 뒤져보는 카뮈의 구절이다. 적나라하다는 것.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나 희망도 품을 수 없다는 것. 그 물컹물컹하고 적나라한 지옥이 어째서 나를 매번 천상으로 인도하는 것일까.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적나라한 환상. 캄캄하고 지루하고 더없이 권태로운 환상. 환상의 다른 이름인, 내 주변의 그 무수한 일상을 바라보고 쓰는 동안,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적나라하다는 것을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세상을 냉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도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층에서 본 나의 시선이 냉소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삶에 대한 나만의 사랑법이라는 것을, 이런 서툰 사랑법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허망하게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 싶다.
고마운 분들이 계시다. 홍신선 선생님과 이종대 선생님을 비롯한 모교의 은사님들. 시에 대해 새 눈 틔워주신 박제천 선생님과 이윤학 선배님. 기회주신 두 분 심사위원님과 동아일보사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영도 선배 윤수 선배 여호 언니 그리고 봉수 오빠와 상연도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이름들이다. 인생은 한바탕 모험이라는 말로 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시인의 잉크를 순교자의 피에 비유하시며 격려주시는 어머니께 당선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이 난감한 소감문을 떠나보내기로 한다.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2001년도 당선작
중편소설
길-아름다운 동행
by 홍은경
단편소설
그날 저녁, 그는 어디로 갔을까
by 노재희
시
이층에서 본 거리
by 김지혜
시조
원촌리 겨울 -이육사 생가에서
by 정경화
단막희곡
말! 말? 말…
by 서인경
시나리오
배오2동사무소
by 박정우
동시
웃는 기와 - 국립경주박물관에서
by 이동찬
동화
아흔 아홉 우리 할머니
by 이은강
문학평론
미술평론
백남준미술의 아이덴터티
by 서기문
음악평론
영화평론
수정의 이름 -'오! 수정'
by 김영찬
동아신춘문예
당선작을 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