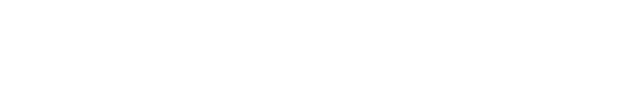당선작 없음
- 심사평
- 김명인(시인·고려대 교수), 김혜순(시인·서울예대 교수)
(예심 최영미 장석남)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시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현실을 벗어나 비상한 시들보다는 친근한 일상을 그대로 묘사한 시들이 많았다. 그런데 왜 그런 일상을 하필이면 시라는 장르로 써야만 했는지, 장르적 자의식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일상을 얼마만큼의 시적 사유를 통해 해석하고, 표현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간혹 현실을 비틀어 풍자를 길어 올린 시들도 있었지만 비문, 오문이 많거나 설명의 문장들을 생경하게 노출시킨 시행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무릇 한 사람이 문학 작품, 그 중에서도 시를 쓴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감각, 고뇌 속에서 그 누구도 쓰지 않은 자신만의 문장, 어법, 이미지를 발견,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용임의 ‘해바라기 모텔’은 시의 대상이 된 부조리한 상황을 능청스럽게 제시하는 솜씨가 돋보였지만, 시에 나타난 국면들엔 구체성이 부족했다. 박혜정의 ‘흑백의 목련나무’는 경쾌하고 발랄한 리듬과 청각적 이미지가 눈에 띄었으나 인생에 대한 해석이 헤프거나 상투적 상상력의 전개가 있었다. 문정인의 ‘붉은 다라이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감을 경쾌하게 다루었으나 상투적 비유들, 묘사를 위한 묘사 문장들이 시의 신선함을 가라앉혀 버렸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으나 단 한 편의 완성도가 있는 작품,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작품, 가능성을 배태한 한 시인을 찾지 못했다.
- 심사평
2007년도 당선작
시나리오
약속
by 정순신
동화
긴 하루
by 김마리아
문학평론
단평중간자 작가의 탄생(『핑퐁』)
by 이광진
영화평론
단평집으로 〈가족의 탄생〉
by 김남석
동아신춘문예
당선작을 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