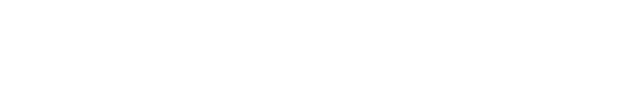왕피천, 가을
by 김미정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 돌아오는 길은 되레 멀고도 낯설었다
북위 삼십 칠도, 이정표 하나 없고
피멍든 망막 너머로 구절초 곱게 지는데.
귀익은 사투리에 팔다리가 풀리면
단풍보다 곱게 와서 산통은 기다리고
한 세상 헤매던 꿈이 붉게붉게 고였다.
숨겨 온 아픔들은 뜯겨나간 은빛 비늘,
먼 바다를 풀어서 목숨마저 풀어서
물살을 차고 오르는 연어들의 옥쇄(玉碎)행렬.
건 듯 부는 바람에도 산 하나가 사라지듯
끝없이 저를 비우는 강물과 가을사이
달빛에 길 하나 건져 온몸으로 감는다.
*왕피천 : 연어가 회귀하는 하천으로는 위도 상 최남단에 있는 하천(울진군 서면)
김미정
1961년 경북 영천 출생
1984년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 국문학과 졸업
- 이우걸(시조시인)
좋은 나무 한 그루를 만나고 싶었다. 깊은 인식의 뿌리가 있는, 건강한 주제의 줄기(기둥)가 있는, 아름다운 수사의 잎이 있는, 새로운 수종의 나무를 만나고 싶었다.
날을 바꾸어 가며 응모작을 읽다가 김영완의 「나비의 꿈」, 김경태의 「그때, 항구는」, 조성문의 「공단의 쑥부쟁이」, 김미정의 「왕피천, 가을」을 가려내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았다. 김영완의 「나비의 꿈」은 잘 정돈된 작품이지만 독자가 향유할 수 있는 상상력의 공간이 지나치게 좁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경태의 작품은 이미지 구사 능력이 돋보였지만 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선자를 망설이게 한 것은 조성문의 「공단의 쑥부쟁이」와 김미정의 「왕피천, 가을」이었다. 처음 읽을 때는 조성문의 작품이 두드러져 보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조명도 시의 적절하고 선명한 이미지에도 호감이 갔다. 그러나 반복해 읽으면서 어떤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목이 긴 여인」, 「헬쑥한 여인」, 「파리한 낮달」등의 수식어구 혹은 수식어의 기계적 배치와 다소의 분장술이 그 원인이라 생각했다. 그에 비해 김미정의 작품들은 응모작 전편의 수준이 고르다는 점에서 우선 신뢰가 갔다. 특히 「왕피천, 가을」은 연어들의 모성회귀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도 예사롭지 않은 수사력으로 시조를 읽는 재미를 풍요롭게 선사해주었다.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이런 시인의 작은 외침도 소중한 것이 아닐까? 비록 새로운 수종은 아니지만 나는 이 나무의 발견을 축복으로 생각했다. 건필을 빈다. 
김미정
1961년 경북 영천 출생
1984년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 국문학과 졸업
첫 아이를 낳았을 때다.
10시간이 넘는 진통으로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가까스로 아이를 순산하고 조금씩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많은 양의 下血로 인해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들면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순간, 좀 전의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귓전을 울리면서 이상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지며 순식간에 전신을 감싸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차가운 몸을 점점 따뜻이 데워주었다.
그 후로도 다시 두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었던 용기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아무런 계산도 없이 다 줄 수 있는 사랑을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자식에 대한 어미의 사랑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연어는 산란을 위해 母川으로 回歸한다.
돌아오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은 미루어 짐작된다.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사랑의 실천 아닐까!
오늘은 첫 아이가 대학에서 논술 시험이 있는 날이어서 새벽에 서울 행 기차를 탔다.
기차가 막 종착역에 이른다는 안내 방송과 함께 울리는 전화벨소리… 그리고 당선 통지!
마치 감독이 미리 장치해둔 짧은 광고필름이 돌아가는 듯, 거짓말 같은 감동이 전화기를 통해 내게서 아이에게로 잔잔히 전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아이의 기억 속에 언제나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남고 싶다.
재주가 뛰어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고민하는…
기왕에 들어선 이 길을,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연어처럼 진정한 용기로 나아가려 한다.
부족한 작품을 選해주신 심사위원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때로는 날카롭게 또한 인자하게 가르침을 주신 민병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부족함을 채워 가는 한결 시조 문우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끝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나보다 더 좋아했음을 밝혀두고 싶다.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2004년도 당선작
중편소설
단편소설
독
by 허혜란
시
독산동 반지하동굴 유적지
by 김성규
시조
왕피천, 가을
by 김미정
희곡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by 이윤설
시나리오
제 3 서고 (第 3 書庫)
by 최명훈
아동문학
동시솟대
by 박예분
동화그림자 각시와 매화무늬 표범
by 조준호
문학평론
영화평론
동아신춘문예
당선작을 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