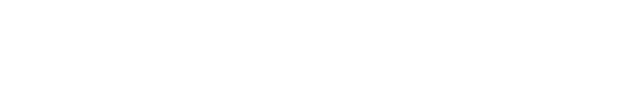새, 혹은 목련
by 박해성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 앙가슴 하얀 새가 허공 한 끝 끌고 가다
문득 멈춘 자리
매듭 스릇 풀린 고요
콕 콕 콕
잔가지마다 제 입김 불어넣는
그 눈빛 낯이 익어 한참 바라봤지만
난시가 깊어졌나,
이름도 잘 모르겠다
시간의
녹슨 파편이 낮달로 걸린 오후
은밀하게 징거맸던 앞섶 이냥 풀어놓고
곱하고 나누다가
소수점만 남은 봄 날
화르르!
깃 터는 목련, 빈손이 사뿐하다
박해성
1947년 서울 생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이근배 시조시인
돋보이는 감성의 붓놀림
모국어의 가락을 가장 높은 음계로 끌어올리는 시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신춘문예에서 읽는다. 올해는 더욱 많은 작품들이 각기 글감찾기와 말맛내기에서 기량을 돋보이고 있어 오직 한 편을 고르기에 어려움을 겪는 즐거움이 있었다.
‘에세닌의 시를 읽는 겨울밤’(이윤훈) ‘새로움에 대한 사색’ (송필국) ‘널결눈빛’(장은수) ‘빛의 걸음걸이’(고은희) ‘도비도 시편’(김대룡) ‘새, 혹은 목련’ (박해성)은 어느 작품을 올려도 당선의 눈금을 채우는 무게를 지니었다.
‘에세닌의 시를 읽는 겨울밤’은 서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음 러시아의 시인의 이름을 빌어 자작나무 숲이 있는 겨울 풍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시어의 새 맛이 덜 나고 ‘새로움에 대한 사색’은 고려의 충신 길재의 사당 ‘채미정’을 소재로 생각의 깊이를 파고들었으나 한문투어가 거슬렸으며 ‘널결눈빛’은 해인사 장경판전의 장엄을 들고 나왔으나 글이 설었으며 ‘빛의 걸음걸이’는 말의 꾸밈이 매우 세련되었으나 이미지를 받치는 주제가 미흡했고 ‘도비도 시편’은 지금은 뭍이 된 내포의 한 섬을 배경으로 역사성을 갈무리해서 완성도를 보였으나 내용과 형식의 새로운 해석을 얻지 못했다.
당선작 ‘새 혹은 목련’(박해성)은 ‘왜 시조인가?’ 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작품이다. 역사적 사물이나 자연의 묘사가 아니더라도 현대시조로서의 기능을 오히려 깍듯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활짝 열고 있다. 감서으이 붓놀림과 말의 꺾음과 이음새가 시조가 아니고는 감당 못할 모국어의 날렵한 비상이 맑은 음색을 끌고 온다. 더불어 시인의 힘찬 날개짓을 빈다. 
박해성
1947년 서울 생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아침에 눈을 뜨고 냉수 한 컵 마십니다, 비수처럼 서늘히 가슴에 꽂히는 한강 줄기! 웅녀가 마셨던 그 강물이 내 몸을 깨웁니다. 이제야 겨우 잡힐 듯한 지독한 불면의 실마리, 그게 바로 시였습니다. 신전의 대리석 기둥 같이 나를 지탱해주는, 아니 저항할 수 없는 견고함으로 나를 압도하는 나의 천국, 나의 지옥 그리고 ...
아버지, 당신의 바람 같은 자유를 증오했고 출구 없는 가난을 저주했으며 타협할 줄 모르는 우직함을 원망했었지만 대책 없이 당신을 닮은 딸이 이 허허한 벌판에 맨발로 섰습니다. 오늘은 따듯한 그 등에 업혀 아이처럼 실컷 울고 싶습니다.
나의 첫 번째 독자이자 절대 팬인 남편 이조훈 님에게 이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명휘 승휘 아들 승규와 새로이 가족이 된 Timothy Meade와 배지현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인이 되리라 다짐합니다.
6년의 습작기간을 채찍질해 주신 지도교수님과 동행한 문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 문학의 모태가 되어준 경기대학교 국문학과에 빛이 있기를!
졸작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고루한 편견 없이 평등의 정의를 실천하는 동아일보에서 희망을 읽습니다.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2010년도 당선작
중편소설
아직 한 글자도 쓰지 않았다
by 정유경
단편소설
미로
by 김미선
시
붉은 호수에 흰 병 하나
by 유병록
시조
새, 혹은 목련
by 박해성
희곡
문 없는 집
by 임나진
동아신춘문예
당선작을 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