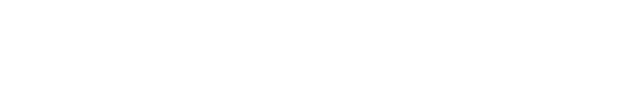먹감나무 문갑
by 최길하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 물 한 모금 자아올려 홍시 등불이 되기까지
까막까치가 그 등불아래 둥지를 틀기까지
그 불빛 엄동 설한에 별이 되어 여물기까지
몇 해째 눈을 못 뜨던 뜰 앞 먹감나무를
아버님이 베시더니 문갑을 짜셨다.
일월도(日月圖) 산수화 화첩을 종이 뜨듯 떠 내셨다.
돌에도 길이 있듯 나무도 잘 열어야
그 속에 산 하나를 온전히 찾을 수 있다.
집 한 채 환히 밝히던 홍시 같은 일월(日月)도.
잘 익은 속을 떠서 문갑 하나 지어 두면
대대로 자손에게 법당 한 칸쯤 된다시며
빛나는 경첩을 골라 풍경 달듯 다셨다.
등불 같은 아버님도 한세월을 건너가면
저렇게 속이 타서 일월도(日月圖)로 속이 타서
머리맡 열두 폭 산수, 문갑으로 놓이 실까.
* [당선자 자선]
백자 연적
절간도 다 타버린 외로 남은 塔 한 채,
밤새 아무도 몰래 눈이 내려 덮이고
동자승 샘물 길러 가 길을 잃어 버렸다.
도라지꽃
뿌리 쓴 꽃일수록 빛은 더욱 고운 법,
양귀비 모란꽃 민들레 도라지꽃
우리네 삶도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까.
연보라와 백설이 살을 섞는 밭 너울에
사리하듯 알몸으로 바람 속에 다 벗고
우리 저 눈맞춤 끝에 걸리는 무지개 되자.
그리하여 그 빛으로만 물드는 세상을
쓴 것이 약이 되어 이 세상을 건지는
가슴에 한 마지기 뜰을 가꾸며 살아가자.
제실(祭室) 은행나무
중시조 할아버지 제실 뒤 은행나문
옻 칠 같은 툇마루에 제 모습을 비춰서
그 영매(影媒) 정받이 하여 많은 열맬 맺는다.
우리네 사는 일도 법화경에 비춰보면
한 방울 이슬 속에 이 세상이 다 들어서
꽃 피고 꽃 지는 길에 무지개로 걸리는 것.
길
길이 길을 떠나가는 억새 숲 바람꽃
돌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강 아우라지
그렇게, 길이 길을 버리는 굽이가 때로 있다.
산길을 가다가 그만 달을 놓쳐버려
그 때 그 막막함이 오늘 다시 떠오름은
아버님 그 환한 등불이 별이 된 까닭일까.
만나고 헤어짐도 어쩌면 저 길 같은 것,
사라졌다 나타나고 품속으로 기울어서
북극성 나침반 같은 점 하나만 찍어 준다.
산 하나가 부서져 모래바람이 되기까지
법화경 글 사이를 길이라 따라가면
이제는 스스로 가라 돋보기도 소용없다.
최길하
1957년 단양 생
1984년 중앙일보 시조 백일장 장원
1994년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
현 성신양회 노동조합 사무장 근무
- 유재영(시조시인·동학사 대표)
70여편의 응모작 중 최종 심의에 오른 작품은 여섯 편이었다. 박소현 <푸드득, 꿈꾸는 아침>, 윤채영 <못물을 보며>, 최하록 <어머니, 세 개의 이미지>, 설혜원 <청량사 배롱나무>, 심석정 <염전에서>, 최길하 <먹감나무 문갑>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염전에서>와 <청량사 배롱나무>, 그리고 <먹감나무 문갑>이 당선을 놓고 마지막까지 겨루었다.
<염전에서>는 치열한 주제의식과 언어를 다루는 솜씨가 돋보였으나 군데군데 음보의 지나친 이탈과 감성을 다스리는 섬세함이 부족했고, <청량사 배롱나무>는 작가의 뛰어난 시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시조의 전통성과 무관한 구성상 문제가 흠이었다.
그와 달리 최길하 씨의 작품은 탄탄한 구성과 함께 미학적인 면과 작품의 성취도에서 단연 앞서 있었다. 그것은 당선작인 <먹감나무 문갑> 외에도 또다른 작품 <백자 연적> 역시 단수이긴 하지만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신인답지 않은 지나친 능숙함에 전혀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조라는 완고한 형식에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정서를 이만큼 담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시조가 아니면 결코 느낄 수 없는 <먹감나무 문갑>이 있는 저 아름다운 언어 풍경을 바라보는 새해 아침, 이 땅에서 시조를 쓴다는 것이 즐겁다. 당선자의 대성을 바란다. 
최길하
1957년 단양 생
1984년 중앙일보 시조 백일장 장원
1994년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
현 성신양회 노동조합 사무장 근무
동아일보와 심사위원께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힘든 세월이 있을 때 안쓰러운 마음으로 염려해주신 '성신양회' 사우 여러분께도….
먹감나무처럼 아버님은 홍시 같은 등불이었습니다. 아마 속 또한 불 밝힌 자국이 꺼멓게 그을려 있으셨을 겁니다. 그 꺼먼 무늬가 해와 달을 품고 산을 이루어서 말입니다. 이제 아버님은 떠나시고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반짝이는 문갑 한 쌍과 함께….
먹감나무의 무늬와 별처럼 빛나는 장식이 서로 꾸며주고 비쳐주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을 헐뜯고 자기 똑똑한 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나 배려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문갑, 장롱, 반다지등 가구를 보면 나무와 장식의 조화가 마치, 맑은 날 밤하늘에 별이 돋은 것처럼 아름답게 서로를 꾸며주고 비쳐주고 있습니다. 나무(木)와 쇠(金)는 서로 상극이지만 서로를 꾸며주고 비쳐줌으로써 상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골집 마당에 홍시가 익으면 우리 모두 하루에도 몇 번씩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도 닭도 늙은 염소도…. 그때 짐승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사물에 자신을 비쳐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不二). 담겨지는 그릇만 다를 뿐 서로 비쳐주고 비쳐보는 사이(間)만 있다가, 그 사이조차 지워지고 다 녹아서 원융(圓融)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면 모든 사물에서 관세음(觀世音)을 보게되고 상대성 원리가 합류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자연계가 무상(無常)히 진행하는 흐름과 균형의 방향성에 대하여, 사물들의 설계도인 대칭의 구조가 균형과 질서의 꽃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숫자로 해독 할 수 있고, 그 궁극은 항상 부등호(=)로 끝나는 것에 대하여 문을 열어 보고자 합니다. 'DNA'를 시의 언어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동아신춘문예
당선작을 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