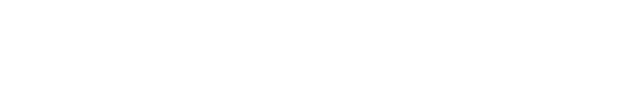가문비냉장고
by 김중일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 내 생의 뒷산 가문비나무 아래, 누가 버리고 간 냉장고 한 대가 있다 그날부터 가문비나무는 잔뜩 독오른 한 마리 산짐승처럼 갸르릉거린다 푸른 털은 안테나처럼 사위를 잡아당긴다 수신되는 이름은 보드랍게 빛나고, 생생불식 꿈틀거린다 가문비나무는 냉장고를 방치하고, 얽매이고, 도망가고, 붙들린다 기억의 먼 곳에서, 썩지 않는 바람이 반짝이며 달려와 냉장고 문고리를 잡고, 비껴간다 사랑했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찾아와서 벼린 칼을 놓고 돌아갔다 매일 오는 무지렁이 중년남자는 하루에 한 뼘씩 늙어갔다 상처는, 오랜 가뭄 같았다 영영 밝은 나무, 혈관으로 흐르는 고통은 몇 볼트인가 냉장고가 가문비나무 배꼽 아래로 꾸욱 플러그를 꽂아 넣고, 가문비나무는 빙점 아래서 부동액 같은 혈액을 끌어올린다
가까운 곳에, 묘지가 있다고 했다 가문비나무가 냉장고 문열고 타박타박 걸어 들어가 문 닫으면 한 생 부풀어오르는 무덤, 푸른 봉분 하나가 있다는,
* [당선자 자선]
두근거리는 신전
허기진 하루가 골목을 어둑어둑 집어먹고 있다
아이들은 밥 먹으러 불려가 하루 햇볕 다 나눠 먹고
창문마다 배가 불러 환하다
닫힌 창문으로 가족들이
너무 오래되어 흐릿해진 상형문자처럼
새겨져 있다 불빛은,
두 눈뜨고도 읽을 수 없는
점자처럼 일어서고
창문과 창문은 더듬거리며 점점 가까워져
뜻을 알 수 없어, 빛나는
글자 하나씩 이어 붙이고 있다
언제쯤이면 明明白白해 질까
담장 너머로 창문은
하나 둘 검은 추를 토해내고
행간에 느낌표로 전봇대가 서 있다
聖所에 꼭꼭 숨어 별들도 나오지 않는 밤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하늘로 고개 들면, 지워진
문장 아래 남은 밑줄처럼
전봇대와 전봇대를 잇는 전선
그 혈관으로 갑골문 같은 통점이 수혈된다
전봇대가 炭柱처럼 캄캄하게 서서
하늘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시간
문설주에, 弔燈 하나가 꺼내 놓은 심장처럼 환하다
,박쥐,
1
순간, 비닐봉지에서, 몇 개의 귤이 굴러, 떨어진다 한 남자, 쓰러진 소금기둥처럼, 바람에 날리고,
전봇대에 걸려, 펄럭거린다, 소망아파트 벽면, 소망까지 가는 길은, 아까우면서도, 멀다, 나뭇가지 위로, 아스팔트 바닥에서, 숨을 고른다, 숨을 놓친다, 승용차 검은, 비닐 봉지를 밟고, 지나간다 뭉클, 터질 내장은, 없다 악성, 빈혈이다, 바람은, 끊임없이 수혈된다, 납작해진 몸피는, 부풀어오른다, 클, 클, 클, 썩지 않는, 웃음이 둥둥, 떠다닌다, 허공에 이빨을, 박는다 계속, 박는다,
한 마리 박쥐가, 아파트 벽면을 가파르게 훑고, 올라간다
2
소망아파트 단지, 검은 비닐봉지 속에 담겨, 흔들거린다 밤새, 흔들리다 새벽,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 한 마리 박쥐로, 化해 부스럭거리는, 남자가 있다, 환한 쓰레기통, 헤집던 남자, 비닐봉지를 건져 올린다, 뒤집는다, 소망아파트가 툭, 떨어졌다 창백하게, 일어선다,
잠시 봄, 햇살이 머물던 자리, 무수히 쉼표가, 떨어져있다 아직도, 허공에서, 부스럭거린다 그만, 쉬고싶다 박쥐는, (,)를 송곳니처럼, 자꾸 박고싶다, 지금은 잠시 봄, 화단은 붉은 사막,
저녁으로의 산책
저물 무렵 출입문을 열자, 막무가내로 길이 그의 몸 속으로 성큼 발을 내딛는다 길은 긴 숨을 내쉬며 어슬렁거린다 뒤꿈치로 바닥을 꾹꾹 밟아보더니, 한 발 한 발 걷는 종아리에 이내 바람이 탱탱하게 들어찬다 순식간에 붉은 차압표가 붙는다 그는 압류된다
공단과 아파트 사이 개나리담장, 잘린 자리에 한 남자가 고무호수로 물을 뿌리고 있다 꽃씨가, 환하게 부서진다 그 환한 언저리에서 붉은 빛 톡톡 터뜨리며, 오래 전 헤어진 여자가 그에게로 걸어 들어온다 밀면 삽짝처럼 힘없이 비켜서던 여자 그를 사랑한다는 한 여자… 문설주와 열린 문 사이, 벌어진 틈처럼 음탕하다 싶어 돌려보낸, 그 길이 그의 몸 속으로 다시 들어와 눕는다
그가 문을 닫자, 길이 신음하며 잘린다 지금은 그의 몸 속에서 공중누각이 부풀어오르는 시간 미처 들어오지 못한 몇 갈래의 길이 그의 마음속 切開地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 방패연 같이 무뚝뚝한 그의 등뒤로, 어둠이 조금씩 날아 앉고 있다 외등이 심장 하나를 꼭 쥐고 깜빡거린다
원룸의 자궁 안에 그는 돌멩이처럼 박혀 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다 모로 누워도 바로 누워도, 꼭 맞는 자세는 없다 망할 봄날! 기어이 여자가 그를 낳은, 花月之風에 젖은 눈알들이 많이도 비처럼 쏟아지는 늦은, 봄날이다
소리들
새벽, 빗방울들이 번지점프 하는 소리 바람이 창문을 홰치는 소리 탁, 스위치 올리면 형광등 기지개 켜는 소리 벽 모퉁이에서 뒤척이던 날벌레 한 마리, 퀭한 형광등에 툭툭 이불 털 듯 날개 터는 소리 쓱쓱 식탁 닦는 소리 사기그릇들 몸 부비며 속닥거리는 소리 숟가락 젓가락 재잘거리는 수다 소리 냉장고 문을 열면, 집들이하던 찬거리들 후다닥 원상복귀 하는 소리 집들이도 못하고 몇몇 끌려나가는 소리 301동 150가구 전기밥솥 더운 입김이 모락모락 올라가 구름 되는 소리 구름이 질퍽한 하늘 귀퉁이로 세 들어 이사 가는 소리……들
아버지, 타이어에서 바람이 조금씩 빠져나가 듯 가는 숨소리 바늘허리보다 가는 그 숨소리 온갖 소리들, 한 두름에 엮어서 슬금슬금 문지방을 넘다가 덜컥, 걸려 넘어지신다
당신, 어디 가시게요?
김중일
1977년 서울 출생
1996년 단국대 공학부 입학
현재 단국대 공학부 3년 재학
- 김혜순(시인·서울예대 교수) , 이남호(문학평론가·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
본심에 오른 작품들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거의 모든 투고작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언어 구사력과 시상 전개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한 개성을 보여주는 작품은 많지 않았다. 새로운 시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상상력이다. 기성 시인의 스타일을 알게 모르게 흉내내고 있는 듯한 작품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은 유감이다. 또한 신춘문예를 의식한 듯한, 상투적 틀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유감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 시적 완성도가 높다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사냥철>,<글자연습>,<거품>,<나비의 가을>,<암말>,<불화그리는 어머니>,<거울을 품다>,<가문비냉장고>,<두근거리는 신전> 등의 작품들이 최종적으로 논의되었다. 어느 작품이던지 당선작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또한 이러저러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 <가문비냉장고>와 <두근거리는 신전>가 돋보였다. 당선자는 쉽게 결정되었지만, 어느 작품을 당선작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두근거리는 신전>은 비유적 묘사가 화려했다. 비유적 언어를 구사하는 솜씨가 대단했지만, 오히려 한 작품 속에 인상적인 비유들이 너무 많은 것이 흠이 되었다. 그리고 비유와 언어의 화려함에 파묻혀 버린 주제의 애매함도 문제가 되었다. 결국 개성적인 이미지와 주제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가문비냉장고>를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당선작 <가문비냉장고>는 매우 흥미로운 상상력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전혀 이질적인 가문비나무와 냉장고를 연결시켜 하나의 의미 공간을 만들어내는 시적 상상력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이 작품은 가문비나무 아래 버려진 냉장고의 이미지를 빌어 와서, 치유할 수 없는 상처 또는 고통의 아우라를 개성적으로 환기시킨다. 나무라는 유기체 이미지와 냉장고라는 무기체 이미지 사이의 단절을 역으로 이용하여 의미를 생성한다. 그리고 왜 하필 가문비나무이고 왜 하필 냉장고인가를 시적으로 설득시킨다. 시상의 전개도 적절하며, 안정감도 있다. 앞으로도 이런 개성적인 상상력을 적극 살려서 삶의 진실을 충격적인 이미지로 드러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당선자에게 큰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의 대성을 기원한다. 아깝게 탈락한 다른 예비 시인들에게도 격려를 보낸다. 
김중일
1977년 서울 출생
1996년 단국대 공학부 입학
현재 단국대 공학부 3년 재학
"알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살게 한다. 나의 깜냥으로 이해 할 수 없었던 일들. 견성, 내가 시(詩)를 짝사랑 할 것이라 누군들 예상했었나.
대학 1년 때 백지 상태에서 처음 읽었던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그리고 시작된 남독의 몇 년, 군대시절 몰래 건빵주머니에 시집을 넣어 다니면, 읽던 읽지 못하던 내 허벅지는 로보캅처럼 단단해졌었다.
유년시절, 구로공단 부근 파란대문 집을 생각한다. 염색공장까지 길게 이어지던 개나리담장, 그 길을 따라 출근했다가 얼굴이 노랗게 물들어서 귀가하던 셋방 누나들, 항상 먼 곳으로만 돈벌러 떠나시던 아버지. 그 모든 아픔에 대해 여전히 나는 겨우 짐작만 할뿐이다. "고통스러운 것들은 저마다 빛을 뿜어내고 있다"는 한 시인의 시를 생각한다.
언제나 타인의 고통은, 내게 두 눈뜨고도 읽을 수 없는 점자와 같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만질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싶어했다. 캄캄하던 시절, 혹 그런 것이 시의 육체가 아닐까 생각했었다. 갓난아이의 꼭 쥔 주먹 같은, 땅바닥에 박혀있는 돌멩이 같은 태초의, 고통의 냄새가 나는 "우리나라 글자"가 나는 좋았다. 그것은 체험의 깊이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차제에 한 번 더 명심해 둔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얼음벽돌집을 짓고, 그 속에서 숨죽이며 있느라 미처 고백하지 못했을 뿐. 위태로운 내 사랑의 영토. 그곳 성소(聖所)의 주인이신 할머님, 큰 스승이신 할아버님, 부모님과 여동생, 두 분 이모님, 일하 삼촌, 진무, 진서,'북어국을 끓이는 아침'에 동기들, 문학회 식구들에게 특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부족한 글을 뽑으며 망설이셨을, 사숙하던 선생님들께 꼭 좋은 글로써 보답 드리고 싶다. 겨우 시작인 것이다.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동아신춘문예
당선작을 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