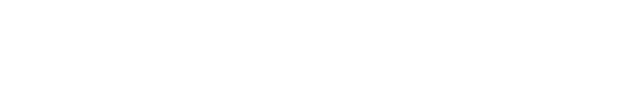촉지도(觸地圖)를 읽다.
by 유종인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 휠체어 리프트가 선반처럼 올라간 뒤
역 계단 손잡이를 가만히 잡아본다
사마귀 그점자들이 철판 위에 돋아있다
사라진 시신경을 손 끝에 모은 사람들,
입동(立冬) 근처 허공 중엔 첫눈마저 들끓어서
사라진 하늘의 깊이를 맨얼굴로 읽고 있다
귀청이 찢어지듯 하행선 열차소리,
가슴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억의 레일
누군가 밟고 오려고 귓볼이 자꾸 붉어진다
나무는 죽을 때까지 땅 속을 더듬어가고
쉼없이 꺾이는 길을 허방처럼 담은 세상,
죄 앞에 눈 못 뜬 날을 철필(鐵筆)로나 적어 볼까
내안에 읽지 못한 요철(凹凸)덩어리 하나 있어
눈귀가 밝던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몸,
어머니 무덤마저도 통점(痛點)의 지도(地圖)였다.
유종인
1968년 인천 출생
1992년 인천전문대학 도서관학과 졸업
1996년 계간 '문예중앙' 시부문 당선
- 이우걸(시조시인)
신춘문예작품들이 가져야 할 미덕은 무엇일까? 아니 우리는 신년호 혹은 그 근일 사이로 만나게 되는 작품들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을까? 독자에 따라 그 주문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선자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작품을 대하곤 한다. 그 첫째는 젊은 시조이길 바란다. 두 번째로는 개성적인 시조이길 바란다. 세 번째로는 무난한 완제품보다는 흠이 보여도 가능성이 많은 작품을 휠씬 더 바란다.
많은 응모작 가운데 이런 관점에서 눈에 띈 작품들은 장기숙, 한경정, 김종길, 유종인 시인의 것이었다. 장기숙은 최근 우리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통일과 관련된 작품들을, 또는 젖은 농촌의 풍경을 균형 잡힌 어조로 노래했다. 한경정은 사소한 사물에도 새로운 발견을 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시인의 작품을 먼저 선외로 가려내었다. 장기숙의 경우 지나치게 안정되어 있고 작품의 폭이 좁다는 생각에서, 한경정의 경우 시어들이 다소 부정확하고 공소한 시구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지적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에서의 견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만큼 위 시인들의 장점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종길의 7편 응모작중 '붕어빵'과 유종인의 5편 응모작 중 '촉지도를 읽다'를 앞에 놓고 고심하였다. 김종길의 경우 다양한 소재를 다룬 모든 응모작품의 수준이 고를 뿐 아니라 특히 위의 작품은 대상을 철저히 묘사하면서 궁핍한 삶의 풍경을 적당한 거리에서 환기시켜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길의 시조들이 강인한 개성을 독자들에게 각인 시키기엔 무언가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유종인의 '촉지도를 읽다'를 당선작으로 뽑았다. 그의 시조들은 호방하고 섬세하며 날카로웠다. 특히 당선작의 경우 그 소재가 특이했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으로 끝났다면 흔히 신춘문예작품에서 등장하는 소재주의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섯째 수가 일구어낸 반성적 사유는 이 시조의 시적 성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성하리라 믿는다. 
유종인
1968년 인천 출생
1992년 인천전문대학 도서관학과 졸업
1996년 계간 '문예중앙' 시부문 당선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시각표를 보았다. 가고자 하는 곳의 시간대를 보니 방금 전에 버스가 떠난 것을 알았다. 배차 간격만큼의 시간을 고스란히 기다려야 했다. 어디에다가도 쉽게 풀어버릴 수 없는 허허로운 시간이 정류장에 머물고 있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기다림이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었다. 먼 길을 가기에 앞서 내 앞에 고여 있는 시간의 물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게 아닐까. 물 거울을 들여다보는 말없는 계절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거기 비친 잎새 무성하던 버즘나무는 갈퀴 머리를 하고 이즈음 제자리서 헤매는 미친 여인네 같다. 제 안에 품은 헤매임이 너무나 많은 가지의 길을 키웠던 것일까. 가을이 오기 전 그 가지들은 가뭇없이 베어져 파란 트럭의 짐칸 가득 실려 어디론가 실려갔다. 어쩌면 내 어지러운 모색이 누군가에게 번다(繁多)한 치장쯤으로 여겨질 때, 나는 그 어지러움 속에서 부드러운 칼 하나 뽑고 싶었다.
차창 밖으로 겨울빛이 빈 들녘에 쏟아 부어지고 있었다. 저 빛들은 다시 봄볕으로 바뀌고 뙤약볕이 되었다가 서늘해진 가을볕으로 멀어질 것이다. 그 멀어짐이 가까워지는 것임을 아는 순간, 겨울빛은 조금 눈물겨울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서 멀어짐으로써 진정 나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을 나는 소외의 장르가 아닌 시조의 문맥(文脈) 속에 찾고 싶었다. 단순히 오래되고 낡은 것만이 아닌 새로움을 그 안에서 캐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 광의(廣義)의 시에 있어서의 시조는 그 중핵(中核)임을 증거하게 해주신 심사위원님과 말없이 마음을 더하여 주신 많은 주위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시에 대한 외도(外道)로서가 아니라 시에 대한 본도(本道)로써 시조의 품격을 감히 생각해 본다. 미약함으로 떠나지만 뜨거움은 늘 가슴에 묻은 채 매진하라고 겨울 숲은 무수한 회초리들로 서 있다. 참 맑은 가난을 한 줌 가지고서 말이다.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2003년도 당선작
중편소설
프라이데이와 결별하다
by 김언수
단편소설
비틀즈의 다섯번째 멤버
by 김나정
시
시조
촉지도(觸地圖)를 읽다.
by 유종인
희곡
다섯 가지 동일한 시선
by 전소영
동아신춘문예
당선작을 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