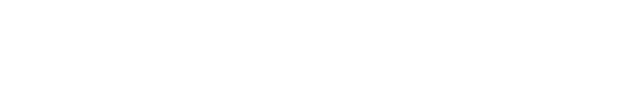당선작 없음
- 심사평
- 김경연 아동문학평론가·황선미 동화작가
모두 224편의 응모작을 읽고 또 읽으며 본심에 올릴 작품을 고심했다. 1990년대 중반, 우리 아동문학, 더 정확히 말해 어린이책 시장이 유례없는 활황을 맞은 지 불과 20년도 채 안 되어 ‘위기’를 논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 20년의 세월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력, 문장력, 상상력, 문제의식, 등장인물의 캐릭터 등 70,80년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동화들이 제법 눈에 띈다. 그런데, 유독 신춘문예 응모작들은 마치 70,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이들 일상의 단편을 그대로 옮겨놓는다거나, 예쁜 동심을 다룬답시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뻔한 그리고 감상적인 이야기들… 이는 아이들의 생활을 다룬 사실 동화이든 판타지 기법을 도입한 동화이든 다 마찬가지였다.
그 가운데서도 4편의 동화를 본심에서 논의했다. 애벌레를 텃밭에 놓아주는 예쁜 마음을 그린 ‘배추 잎 하나 들고’(김은영)는 구성력도 있고 문장도 안정적이었으나 아무리 보아도 캐릭터의 의식이나 행동이 설정 연령과 어울리지 않았다. 마음이 아픈 엄마에게 햇볕을 가득 담은 유리병을 선물해주며 엄마를 위로해주는 이야기 ‘유리병’(오미순)은 그 천진난만한 태도가 현실감을 획득하기 어려웠다. 밤에 어디론가 나가는 아빠의 정체를 바라보는 ‘아빠의 은밀한 외출’(임인재)은 문장이 안정적이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전개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너무도 뻔하게 드러났다. 어른들 눈에만 예쁜 가짜들이 받는 상장 대신 자신들 스스로 진짜 상장을 준다는 이야기 ‘위 학생을 칭찬합니다!’(황성진)는 ‘상장’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어른들의 비합리적 태도에 비판적으로 대항하는 아이들의 자기의식을 담아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미 학교에서 여러 종류의 상장들이 수여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새롭지 않았다.
신춘문예에서 무슨 걸작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엄연히 아직도 공신력 있는 등단의 절차이고, 그렇기에 신인으로서의 패기와 단단한 공부의 흔적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심사위원들은 장고 끝에 이러한 기대를 담아 당선작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선작을 내는 것보다 더 어렵고 착잡한 일이었다. 동화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더 큰 기대이자 격려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
- 심사평
동아신춘문예
당선작을 감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