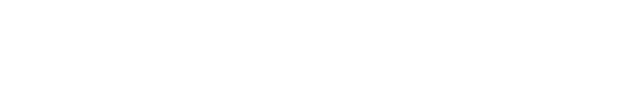선잠 터는 도시
by 정인숙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 1.
선잠 털고 끌려나온 온기 꼭 끌안는다
자라목 길게 빼고 순서 하냥 기다려도
저만큼 동살은 홀로 제 발걸음 재우치고
나뭇잎 다비 따라 꽁꽁 언 발을 녹여
종종거릴 필요 없는 안개 숲 걸어갈 때
여전히 나를 따르는
그림자에 위안 받고
2.
정원초과 미니버스 안전 턱을 넘어간다
목울대에 걸린 울화 쑥물 켜듯 꾹! 넘기고
몸피만 부풀린 도시,
신발 끈을 동여맨다
정인숙
1963년 서울 출생
수산물 거래 개인사업
- 김혜순 서울예대 문예창작교수·조강석 연세대 교수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을 일별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개성적인 목소리가 드물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동화적 상상력에 기대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지만 매력적인 문장을 찾기 어려운 작품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공들여 말들을 조직해 놓았지만 그 이음새만 불거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쉽게 몇몇 기성 시인들의 영향을 떠올릴 수 있는 작품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그렇지만 당선권에 든 몇몇 작품들의 우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숙고를 거듭해야 했다. 「말이 간다」외 5편의 경우 역시 동화적 상상력에 기대고 있지만 풍부한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이미지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뜻이 투명해지는 신선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고른 수준의 말끔한 작품들 중 당선작이 될만한 개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 「무너진 그늘을 건너는 동안 어깨에 수북해진 새들」외 5편은 장점과 단점이 같은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틀림없이 개성적인 자기만의 문장이 돋보였으나 이로 인해 때로는 어설프고 작위적인 문장이 돌출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짧지 않은 의논 끝에 결국 우리는 「우유를 따르는 사람」을 당선작으로 고르기로 결정했다. 일상을 이야기로 벼리고 여기에 재기를 담아 삶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을 흔드는 힘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이었다. 가상과 가정의 세계를 덧붙여 무늬를 짜는 솜씩가 일품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예사로워 보이는 비범함을 기대하게 하는 작품들이었다. 당선을 축하하며 더 큰 성취를 기원한다. 
정인숙
1963년 서울 출생
수산물 거래 개인사업
지하철이었다. 거기서 이름을 들었다.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처음 듣는 목소리로부터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다. 어제는 호명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그렇게 되었다. 이것도 삶이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시가 꼭 내 것만 같았다. 어느 날부터는 시가 나보다 나았다. 시를 쓰고 거기서부터 떠나는 게 좋았다. 또 어느 날엔 시가 나보다 훨씬 더 나았다. 노란 옥스포드 노트에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거기에 살고 있는 기분 같은 게 있었다. 더 이상 노트에 적지 않고 타이핑을 했다. 어느 순간에는 손가락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것도 같았다. 거기에 삶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상관이 없다. 초대 받은 시도 그렇게 나왔다. 앞으로도 즐겁고 외롭고 무지한 일들이 펼쳐질 거다.
문을 열어준 김혜순·조강석 선생님께 감사를 표한다. 이승하 선생님께 각별한 마음을 전한다. 천변을 함께 걸었던 그날의 이수명 선생님은 사랑하는 시인이다. 김근 선생님, 그리고 빠트릴 수 없는 작인(作人)이 있다. 더 아득한 곳에 윤한로 선생님도 있다. 예쁘기만 했던 학창시절의 그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해 미안하다. 반드시 불러야 하는 이름도 있다. 하형은 거의 모든 시를 함께 읽어주었다. 그리고 수영과 신지도 있다. 울고 싶지만 울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 없는 이름도 있다. 이런 것도 삶이다.
무궁한 세계에 사는 엄마 아빠. 그 둘 아래서 나는 자랐다. 함께 자란 동생도 있다. 더 많은 선생, 더 많은 사람과 어딘가로 향한다. 거기에는 꽃도 있고 새도 있다. 나는 이게 진짜 삶이라고 말해본다.
- 작품전문
- 심사평
- 당선소감
동아신춘문예
당선작을 감상하세요